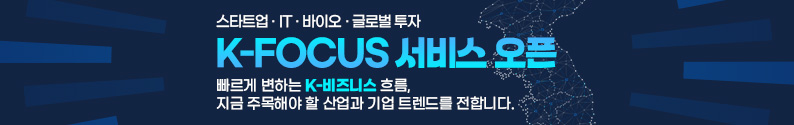▶ Based on “Does Featu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Help or Hurt Fashion Marketing Effectiveness?”(2025) by Wang & Wei i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62(4), pp. 582–600.
2020년대 초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보디포지티브(Body Positive)’ 운동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 패션 브랜드가 체격이 큰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적극적으로 선보였다. 그러나 최근 위고비와 같은 체중 감량제가 유행하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이 약화되자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한편 장애인 모델 기용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2020년 구찌가 다운증후군 모델을 내세운 캠페인에는 긍정적 반응이 따랐지만 2022년 마찬가지로 다운증후군 모델을 기용한 빅토리아시크릿에는 일부 찬사와 함께 ‘착취적인 브랜딩’이란 비판이 따르기도 했다. 장애를 자신들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난이었다.
그렇다면 ‘다양한 몸’을 포용하는 것은 브랜딩에 실제로 효과적일까. 장애인 모델의 마케팅 효과를 연구한 국립싱가포르대 연구진은 장애인 모델을 기용하는 것이 ‘브랜드 따뜻함(Brand Warmth)’과 ‘브랜드 멋짐(Brand Coolness)’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연구진은 페이스북 광고로 A/B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의족을 착용한 모델이 등장한 광고(3.01%)가 그렇지 않은 광고(2.04%)보다 클릭률이 더 높았고 클릭당 비용은 28%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모델을 기용할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가 모델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플러스 사이즈 모델보다 장애인 모델의 마케팅 효과가 더 강력하다는 점도 밝혀졌다. 198명의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팔 한 쪽이 없는 모델과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탱크톱을 착용한 사진을 보여주며 참여자들의 태도, 감정 등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장애인 모델에 대해 참여자들은 브랜드 따뜻함과 멋짐을 인식했으며 자기동일시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본 참여자들은 브랜드에 대한 따뜻함, 멋짐을 인식하지 못했고 나아가 모델에 대한 자기동일시가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장애는 통제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식되는 반면 체형은 대체로 통제 가능한 선택의 결과이기에 소비자가 플러스 사이즈 모델에 부정적인 자기동일시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속 실험에 따르면 장애인 모델 기용의 긍정적인 효과는 장애인 모델을 선도적으로 선보인 ‘퍼스트 무버’에 더 크게 나타났다. 후발 주자의 경우 업계에 형성된 규범을 따르기 위한 수동적 행동으로 비춰졌다. 한편 브랜드가 특정 신체를 비하해 논란에 휩싸이는 등 잘못을 저지른 전적이 있을 경우에도 마케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르거나 큰 몸을 비하했다는 오명을 안고 있는 빅토리아시크릿의 장애인 모델 기용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이유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모델을 늘리는 것은 브랜드의 따뜻함과 쿨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모델 채용이 대세로 자리 잡기 전 주도적으로 장애인 모델을 내세운 브랜드가 그 유익을 선점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에 장애인은 16%에 이르지만 장애인을 모델로 세운 캠페인은 0.02%에 불과하다. 다양한 브랜드 전략이 승부를 겨루는 지금, 장애인 모델이 하나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 동아비즈니스리뷰.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인기기사